평화주권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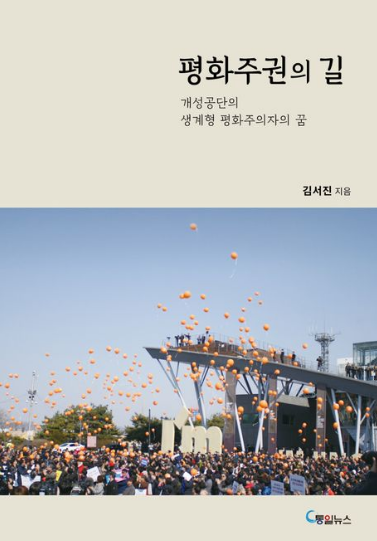
책 정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보통의 사업가일 뿐이었다.
북한 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정도 들었고 별 탈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별 탈 없이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평화를 의미했다. 그들이 애초에 평화주의자들도 아니었다...개성공단 공장운영의 전제조건이 평화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평화는 공단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하자마자 평화주의자가 된 셈이다. 이를 우스개 얘기로 ‘생계형 평화주의자’라 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개성기업인들과 필자는 ‘생계형 평화주의자’에서 그냥 ‘평화주의자’로 바뀌었고, 그 평화주의자들은 또다시 ‘생계형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개성공단을 만들어갔던 사람들 한명 한명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였다. ...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흘린 땀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굳건해지는 듯했다. 북한도 휴전선 바로 북측에 있는 개성공단이 들어섰던 지역에 주둔했던 엄청난 화력을 갖춘 군대를 저 멀리 옮겨 함께 피스 메이커가 됐다.
평화자본이었다. 평화가 전제조건인 자본이면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확장해가는 것을 그 속성으로 하는 평화자본이었다... 최소한의 평화를 전제로 투자된 자본이면서 자본이 유지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평화이며, 평화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본질로 삼는 자본이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에 투자된 자본은 이러한 성격에 부합한 평화자본이었다.
개성공단은 평화자본의 세계사적 산증인이었다. 소통이 축적되어 남측 주재원인 ‘나’의 눈이 바라보는 곳과 북측 노동자 ‘너’의 눈이 바라보는 곳이 어느덧 겹쳐질 때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되는 순간 한반도의 냉전체제라는 거대한 벽에 가느다란 구멍이 생겼다. ‘평화’였다. ‘평화’는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평화자본의 힘이었다.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 이념과 제도, 살아온 역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었다. 그 ‘우리’는 ‘개성공단 사람들’을 공동의 이해관계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평화’였고 함께 생계형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평화자본의 힘이었다.
남과 북이 천번 만번 만나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제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남과 북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었다.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에 투자한 자본은 평화자본이다.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화자본의 양적 증대야말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한반도 평화의 보증수표였다.
댓글목록0